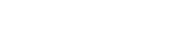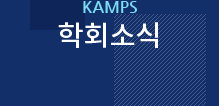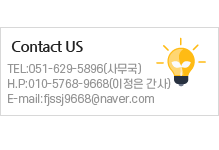|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5-04-17 13:55:32 | |||||||||
|
||||||||||
[세월호 1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참사] 사고 수습용 '해경 간판 바꾸기' … 안전은 없었다'수사 영역 해상 한정 … 구조·구난 업무 여전 '사실상 조직개편' |
||||||||||
 |
| ▲ 지난해 11월18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해양경찰청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인천일보DB |
▲껍데기만 바꾸고, 혼란 부추기고
박근혜 대통령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해경 해체'를 선언한 지난해 5월19일부터 해경은 혼란에 휩싸였다.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해경이라는 두 글자는 무거운 짐이 됐다. 현장의 한 직원은 "어린 자녀들도 '직장이 없어지면 어떡하느냐'고 묻곤 했다. 사기가 낮아졌을 뿐 아니라 구체적 정보도 없이 소문만 무성하면서 업무가 붕 떠 있었다"며 "특히 기획·수사·정보 업무는 이관을 염려해 마비된 상태"였다고 했다.
해경본부는 여전히 해상 감시와 구조·구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수사 영역만 '해상'으로 한정됐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해체가 아닌 조직 개편이었지만, 여파는 만만치 않았다. 사고 수습과 혼란을 틈타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린 것이다. 지난해 6~12월 서해 5도에 나타난 중국 어선은 한 해 전보다 월 평균 600여척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 서해에서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은 259척으로 2013년(413척)보다 크게 줄었다. 해상 치안력이 약해질 거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한국해양경찰학회가 지난해 12월 펴낸 '한국 해양경찰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조직 개편으로) 해상 치안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첩보·정보 활동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경비안전본부와 5개의 지방본부로 분리·운영돼 지휘체계의 분리를 가져왔다. 통일된 전략 수립이 어려워지고, 중앙기관 통제력이 낮아져 기관 간 의사소통도 힘들다"고 분석했다.
▲안전보다 변화가 먼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바다에는 안전이 자리 잡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25일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 실태'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관리하는 낚싯배 68척이 선박검사증서에 있는 항해 조건과 다르게 운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인천해경서 관내 유선(유람선)·도선(단거리 여객선) 사업 안전교육 대상자 238명 가운데 133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이용객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전보다 변화에 공을 들인다. '해경 해체'로도 모자라 인천에 있는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설이 나도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올해 안에 세종시로 옮기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도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양을 책임지는 기관이 바다를 떠나 내륙으로 향하면 그만큼 안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해경 고유 기능을 살려 안전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탁상공론'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장과 가까워야 한다는 건 상식"(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국회의원), "세종시 이전은 서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는 당연한 주장도 다시금 되풀이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 이전글 | 박동균 교수, 세월호 1주기, 국가정책’ 토론 |
| 다음글 | 관동대 이영남 교수 |